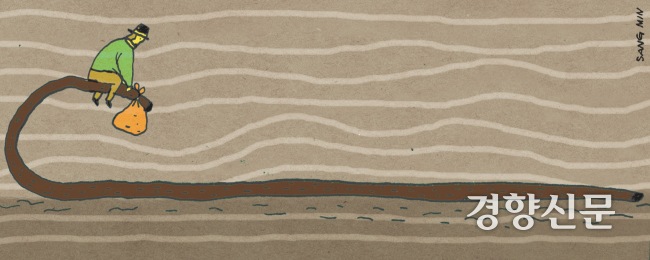노인요양시설에 부모님 등 어르신이 입소해있는 가족 보호자 다수가 임종과정에서의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하지만, 일부만이 임종기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일러스트·김상민 화백 |
노인요양시설에 부모님 등 어르신이 입소해있는 가족 보호자 10명 중 9명이 임종 과정에서의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하지만, 당사자와 임종기 돌봄 방식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나눈 경우는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할지 방법을 몰라서 망설이다가 어르신의 상태가 나빠지면서 대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11일 건강보험연구원은 ‘노인요양시설 임종기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7월28일부터 8월29일까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가족 보호자 1061명을 대상으로 가족보호자의 임종기 돌봄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한 가족 보호자는 입소자의 딸(41.4%), 아들(40.1%), 며느리(13.2%), 배우자(2.75), 손자녀(1.1%), 사위(0.8%) 등이었다.
응답자의 88.3%는 어르신이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을 경우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연명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 행위를 말한다.
가족보호자들은 희망하는 임종장소로 노인요양시설(41.2%), 병원(38.9%), 호스피스 시설(13.1%) 등을 꼽았다. 어르신이 노인요양시설에서 임종을 맞길 원한다고 답한 이들은 ‘익숙한 직원들의 돌봄을 받으며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45.3%)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병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아서(29.1%)’가 그다음으로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24.2%만이 임종 장소, 연명치료 의향 등 임종기 돌봄 방식에 대해 가족 간에 직접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답했다.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이유로는 ‘(어르신의) 기능이 나빠져 대화가 불가능해서(58.8%)’가 가장 많았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잘 몰라서(38.4%)’, ‘나 스스로 임종과 관련하여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28.5%)’ 등이 뒤를 이었다.
어르신과 직접 이야기를 나눈 가족 보호자의 92.2%는 임종기 전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미리 어르신 본인이 희망하는 돌봄 방식에 어르신과 가족이 함께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가족 보호자의 75.0%도 어르신과 미리 임종기 돌봄 방식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구진과 심층 인터뷰를 한 일부 가족보호자들은 어르신이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사전 연명 의향서를 미리 작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기를 놓쳐 아쉬워했다. 또한 병원 전원을 반복하는 것보다 요양원에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길 원했다. 다른 가족의 임종을 겪은 후에야 사전연명의료 제도와 절차를 알게 되었다는 경험을 풀어놓는 경우도 많았다.
가족 보호자들은 어르신이 갑작스럽게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요양기관 입소 시 설명을 듣고 병원·요양원에서 가능한 선택이나 돌봄 방향을 상의하는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존엄한 죽음을 위해 요양시설에 임종실을 마련하고, 종교의식 지원과 함께 전문 상담사(임종관리사 등)를 의무 배치해 보호자 상담과 임종 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